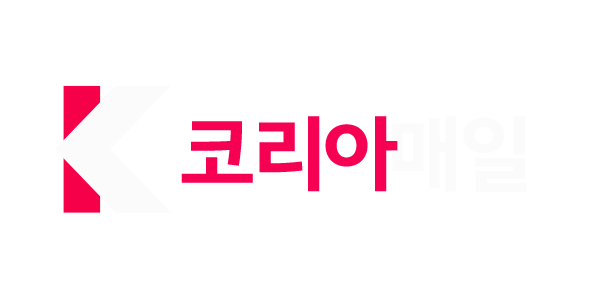"中과 美는 한국 라면이 좋아" K-푸드 수출액 10년 만에 '두 배 폭증'
 한국 식품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K-푸드' 수출이 최근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10년간 K-푸드 수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15년 35억 1천만 달러에서 2024년 70억 2천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 식품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K-푸드' 수출이 최근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10년간 K-푸드 수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15년 35억 1천만 달러에서 2024년 70억 2천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K-푸드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8%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최근 5년(2020년~2024년) 동안 더욱 가속화되어 연평균 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동시에 한류의 글로벌 확산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K-푸드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라면이다. 2024년 기준 라면 수출액은 13억 6천만 달러로 전체 K-푸드 수출의 약 19.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라면은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20.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 K-푸드 수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한국 라면 특유의 매운맛과 다양한 맛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을 방증한다.
2023년 기준 한국 라면의 세계 수출 비중은 20.6%로, 세계 라면 수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라면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라면, 불닭볶음면 등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들은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얻으며 K-푸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다.
라면에 이어 간편식(9억 8천만 달러), 음료(9억 4천만 달러), 건강식품(8억 2천만 달러), 조미료(6억 5천만 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높았다. 특히 건강식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1.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라면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 홍삼 등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미김 역시 연평균 1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K-푸드의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삭하고 짭조름한 맛의 조미김은 서구권에서 건강한 스낵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푸드 수출 대상국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24년 기준 K-푸드 수출 상위국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미국 내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6위→4위), 필리핀(7위→5위) 등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미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 영향력과 건강식품 선호 트렌드가 지속되며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식품이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하며 유통망이 확대되고, 한국 식품 프랜차이즈 매장 증가와 현지 마케팅 강화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라면, 김치, 고추장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식품 전문 유통업체들도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K-푸드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K-푸드 수출 성장의 배경에는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큰 역할을 했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K-푸드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라면, 즉석밥, 냉동식품 등 간편식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의 발달된 간편식 기술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은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 한국 음식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식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류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유통망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